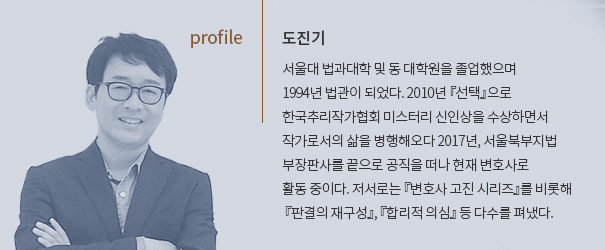|
구독 신청
|
‘왜 법률가이면서 소설을 쓰는가’하는 주제의 원고 의뢰는 난감하다. 판사로 일하면서 추리소설을 출간했으니 ‘파격의 인간이 아닐까’하는 시선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북을 떠나지 못하는 나침반 바늘 정도의 인생이었다. 조직원은 당연히 조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직 논리와 관습에 적응하고 몸을 맞추어야 한다. 반면 ‘판사’라는 직업은 독특한 면이 있다. 독립기관이라는 특성상 조직 눈치를 덜 보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길도 가능하다.
수직의 삶과 수평의 삶. 내가 판사로서 첫발을 내디딜 때, 이 두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느꼈다. 둘 다 가치 있겠지만, 난 후자를 택했다. 그게 내 기질에 맞았다. 적어도 2~30년간 판사로 일할 텐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인생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았다. 그렇다 해도, 내 기질이 반골 쪽은 아니었다. 의지대로 산다고 해도 법률가라는 한계를 깨버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그 틀 안에서 나름의 몸부림을 쳤던 것 같다. 어항 벽을 쿵쿵 머리로 들이받으며 돌아다니는 물고기라고나 할까.
2007년에 간통죄 위헌제청을 했다. 지금은 간통을 왜 국가가 처벌해? 하는 사고가 당연하지만 당시엔 크게 시끄러웠다. 간통죄에 논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판사가 실정법에 어긋나게 무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위헌제청을 했다. 다른 눈치를 볼 이유는 없었다. 법원에서는 크게 놀라 언론에 새어나갈까 쉬쉬했지만, 결국 9시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법원 고위층의 나를 향한 시선이 불편한 쪽으로 기울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다.
몇 년 후엔 스페인 연수를 떠났다. 법관들은 일정한 근무 기간을 채우면 1년 정도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그때까지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전부였다. 난 알파벳부터 시작해 스페인어를 새로 공부했고, 법원 1호로 스페인 연수자가 되었다. 스페인? 주위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내 부러움의 눈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이후 줄줄이 스페인 연수자가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스페인에서의 1년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그 이후로는 줄곧 완만한 내리막).
마흔이 넘어 추리소설을 썼다. 또 뉴스에 나오고 화제가 되었다. 그게 그렇게 남다른 일인지, 그땐 몰랐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추리, 무협, 판타지가 좋았고,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 안에서 창작 욕구가 꿈틀댔고, 난 그걸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해도 많았다. 언제 글을 쓰는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시간은 대개 문제 되지 않는다. 골프도 등산도 하지 않고, 드라마도 보지 않으니 시간은 얼마든지 생겨났다. 실리는 없었다. 글 쓰느라 눈이 침침해졌고, 출판시장은 최악이었다. 그래도 내 안의 상상력, 창작열이 글을 쓰게끔 했다. 그게 솟아나는데 안 쓸 수 없었다. 작은 이유를 덧붙이자면, 창작은 판사직의 중압감을 잠시 잊는 숨구멍이기도 했다.
이야기가 조금 새지만, 판사는 내게 애증의 직업이다. 애정은 이런 면이다. 일상적인 불편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내가 물가를 잡는다든지 하는 거창한 일은 못해도, 구렁텅이에 빠진 ‘개인’을 도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이 힘든 작업을 지탱하게 해준다. 반대로 싫은 부분도 있다. 판사는 조그만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매사에 조심스럽고 사는 폭이 좁아진다.
법원은 분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자칫 그 타깃이 심판인 판사에게 향할 수 있다. 판사는 공격자와 맞서 싸울 수 없다. 판결문을 떠나서는 일체 말할 수 없으니까. 일상도 그저 그렇다. 외부의 시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타이타닉의 1등 칸에도, 3등 칸에도 타지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그저 외로울 뿐이다. 생활인으로서 이 직업이 참 별로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럼 난 이걸 왜 하고 있는가. 혹시, 그저 이미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왔기 때문은 아닐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글을 쓰기 잘했다고 생각한다. 법률이 신성한 생계라면, 소설은 내 삶의 의미다. 처음 책을 낸 후, 현직 판사가 소설을 쓴 경우가 있었나 찾아보았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는 것 같았다. 다만 독일에 베른하르트 슐링크가 있었다. ‘세계 최초’에는 실패했지만, 지인들은 농담 삼아 ‘동북아 최초의 판사 출신 소설가’라고 부른다.
돌이켜보면 난 혁명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법률가 인생에서 ‘약간 달리’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동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었고, 이제는 떠나온 곳이 아득해서 보이지도 않게 돼버렸다. 아이스크림의 토핑이 맛을 결정하듯, 2%의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