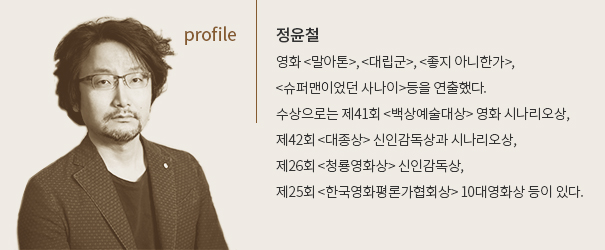|
구독 신청
|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1년 1월, 지병과 경제적 사정이 겹치며 32세의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자취방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던 故최고은 작가는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재원이자 막 사회 진출을 모색하던 신인 시나리오 작가였기에, 그녀의 예기치 못한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 순간은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는 당시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드러내는 참담한 상징으로 부각되어, 정치권이 곧바로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발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권이 두 번 바뀌는 동안 그녀는 까마득히 잊혀졌다가 놀랍게도 최근에 다시 대통령의 아들인 또 다른 문화예술인의 파렴치함을 극대화하려는 정쟁에 이용되며 다시 세상에 소환되었다.
대통령의 아들이 예술 지원 프로그램에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있었냐는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금수저에게 줄 국가 지원금을 차라리 다른 가난한 최고은들에게 줘야 한다는 식으로 고인을 멋대로 소환해 끌어다 붙인 정치적 상상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태 속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문화적 지원과 복지에 대한 관점이 사회적 동정심, 즉 가난한 예술가들이 굶어 죽지 않게 푼돈이나마 도와줘야 한다는 ‘적선(積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영화 〈서편제〉를 보면 소리꾼들이 부잣집 잔치에서 노래하고 떡이나 음식을 얻어와 굶주림을 달래는데, 지금도 정확히 그 정도 언저리에서 문화예술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금을 정당히 받아 자기 밥벌이이자 창작활동을 하겠다는 설치 미술 아티스트에게 불행한 죽음까지 소환한 난데없는 신파극을 들이밀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걷어찬, 가난한 예술가들 밥숟가락을 뺏은 파렴치한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나는 이 글에서 권력자의 아들을 비호하거나 그가 충분히 정당한 심사를 통과해 돈을 받을 재능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그저 가난하고 배고픈 불쌍한 예술인들에 대한 동정심 정도로 여기는 사회적 관점이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동정심으로 과연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하는가? 전철역에서 구걸하는 분들, 노숙인들에게 주머니의 동전을 털어주거나 자선단체에 월 몇 만 원을 기부하는 게 고작일 것이다. 것도 늘 아까운 마음에 망설이는 일도 잦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과 자녀들의 지적 영역을 넓히고 감수성과 세계관을 성장시키며, 지친 노동에서 달래줄 여가를 즐기는 일이라면 그렇게 망설임이 들까? 아마 한 달에 몇십만 원 이상은 분명 쓰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영화 및 공연을 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쓰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는 일에 적지 않은 돈을 매달 지출하면서도 그리 아까워하지 않는다. 남을 위한 동정이나 적선이 아니라 나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쓰는 당연한 예산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도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봐져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지출이 가난한 예술인들에 대한 동정심 차원이라면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게 되고,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부담이 커져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가난한 예술가들을 위해 쓴다는 전제가 있기에, 대통령 아들인 예술가와 가장 가난했던 한 예술가를 비교하며 싸움을 붙였듯 이른바 ‘선별 복지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이 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논쟁을 되돌아보자. 대기업 총수의 아들도 세금을 들여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고 질문했던 선별 복지론자들에게 시민들은 ‘그렇다. 줘야 한다’고 대답하며 ‘보편적 복지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아이들의 밥만큼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당연히 누구에게나 줘야 하는 국가적 기본 의무이고, 또 선별 복지는 결국 가난한 아이들을 전제로 한 동정적 관점일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계층을 가르는 부작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예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산이 국가가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배고픈 영혼들의 무료급식을 위해 기본으로 해야 할 당연한 지출이라고 여긴다면 가난한 예술가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만든 시혜적 예산 운운의 얘기는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故최고은 작가를 갑자기 끄집어내 대통령 아들을 비판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는 만행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했던 정치인도 더이상 비난하고 싶지 않다. 개인의 인식은 사회적 인식의 영역을 크게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금수저든 흙수저든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산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슬픈 광경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부자가 지하철을 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돈을 더 안 냈다고 비난하는가? 한편 가난한 자에겐 더 깎아주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 또한 이러한 기간 산업, 필수 산업으로 여기고 재벌 총수이건 권력자 아들이건 가난한 서민들이건 똑같이 혜택을 받아 마땅한 보편적 인프라로 여길 때 진정한 복지와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전제하에서만 내가 낸 세금으로 오로지 가난한 예술가들에 대한 동정심과 적선을 베푸는 게 아닌, 진정 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영혼을 살찌우는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지출을 하는 것임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동의와 인식이 세워졌을 때, 우린 보다 적극적이고 풍부한 문화예술 복지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 또한 자신이 일개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을 지닌 사회적 주체이자,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간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 나라 문화예술을 지탱해나가고, 점점 메말라 가는 국민들의 영혼에 대한 보편적 무료급식을 제공할 무한한 에너지원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재능있는 작가였다. 어리석고 무책임하게 자존심 하나만으로 버티다가 간 무능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녀를 예술의 순교자로 만드는 것도, 알바 하나도 안 한 무책임한 예술가로 만드는 것도 우리 모두가 지양해야 할
양극단이라는 것만은 말해두고 싶다”
-소설가 김영하(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역임)